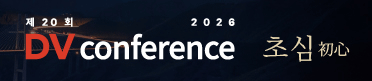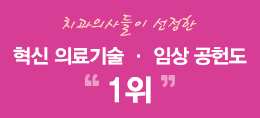건강보험 수가결정방식은 매년 수가협상을 전후해 도마 위에 오른다. 토론회가 열리고 협상 당사자 중 일방이 협상의 권한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지만, 잠시 지나고 나면 그뿐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소위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이란 것이 지난 연말 열리긴 했다. 그 자리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용의 객관성과 의사결정의 다수결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심포지엄이건 토론회건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꿈쩍도 않는다. 그래봐야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당국의 시각으론 이 새로울 것 없는 문제 제기가 이슈가 된다는 자체가 오히려 문제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주장의 요지를 한번 알아나 보자.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정심은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 대표 8인으로 구성되므로 일견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들의 성향에 따른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를 같이 보더라도 공익대표 8명이 모두 정부 측 사람들이거나 정부 측에서 위촉한 사람들이다.
이런 구조에서 다수결이란 무얼 의미하는가. 근거에 의한 타협은 애초부터 설 자리가 없다. 숫자로 밀어붙이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선택으로 여야를 나눈 국회도 날치기다 뭐다 해서 밀어붙이기식 표결을 지탄하는데, 하물며 건정심은 팔이 안으로 굽는 공단 내 기구가 아니던가. 이건 뭐 애 팔을 비틀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1차로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은 페널티까지 부가한다. 고분고분 말을 안 듣고 쓸데없이 문제를 키웠으니 벌을 준다는 식이 아니고 뭔가.-
협상결렬 됐다고 ‘페널티 부가’도 말 안돼
이 연구원은 이런 애 팔 비틀기식 수가결정 구조의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급여와 보험료를 심의, 결정하는 구조에서 조정기능과 결정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결정 기능은 기존의 건정심이, 수가조정 기능은 별도의 법정기구가 맡아줘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건정심 위원 임용기준의 객관성을 따진 것인데, 기준을 바꿔 공익대표의 경우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를 추천하여 위원으로 위촉하고, 가입자 대표의 경우도 정부가 임의로 선택할 여지를 없애도록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어떤 경우든 지금까지 공단 측이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었던 표결방식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외에도 이 연구원은 ‘수가 조정기능의 활용을 공식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가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건정심과는 별도의 법정 조정기구를 통해 합의조정에 나서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에 붙이는 방안이 그것인데, 이 경우의 별도 기구는 수가 협상이 결렬된 유형별 대표와 가입자 대표를 동수로 구성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와 양측이 동의하는 1인의 위원장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주장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유형별 협상 결렬 이후 전개되는 건정심에 의한 수가결정 시스템이 일말의 합리성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선 수가의 조정기능과 결정기능을 나누어 결정기능을 건정심이 아닌 다른 기구에서 관리토록 하고, 위원 임용에 있어서도 공익 대표 8인 중 4인은 공급자 측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는 돼야 적어도 보험당국은 ‘다수결에 의한 현행 수가결정 구조가 지극히 폭력적’이라는 의료계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애 팔비틀기식 수가통제는 이젠 곤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차례다. 공단 측이 지금까지 관련 토론회나 심포지엄에서 나온 이런저런 개선 방안들에 한번쯤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수가결정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공단과 복지부를 움직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정부 쪽 사람들을 옭아매는 것은 바로 계수가 너무나 분명한 재정이기 때문이다.
재정의 한계가 곧 정부 측 운신의 한계인데, 그렇긴 하더라도 재정이 수가를 결정하는 현재의 건강보험 구조엔 의료계로선 쉽사리 동의하기가 어렵다.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의협 쪽 연구원의 개선 방안이 꼭 최선책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것보다 분명한 건 어떻게든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재정악화의 원인을 자꾸 의료계 쪽에서만 찾으려든다. 이건 공급자 측으로선 여간 불합리한 편견이 아닐 수 없다. 남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하는데도 보험 당국은 자신에겐 눈을 감은 채 상대에게만 끝없는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래서야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나.
지금이라도 보험당국은 애 팔 비틀기 식 수가통제 장치 뒤에 숨어 의료계를 옥죄는 안일한 재정운용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넓게 문제를 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의료계도 안심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