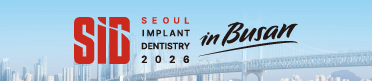“만약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승리했다면,” 이런 역사의 가정법은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고 한다. ‘나만 옳을까?’라는 칼럼 세 편의 글 머리였다(2014. 7).
1편은 그해 8월에 실리고 함께 보낸 2·3편이 나오기까지 근 2년이 걸린 이유를, 편집인의 실수라고 둘러대지만, 필자는 살아있는 문학권력에 대한 비판을 꺼리고 노벨문학상 기대주인 작가를 배려한 것으로 본다. 바로 시인 고은 얘기다. 첫 편 ‘과거사 청산’에서는 많은 한국인이 부러워하는, 나치 부역자에 대한 프랑스식 청산을 살폈다. 프랑스는 제1차 대전 패전국 독일에 지독한 배상금을 부과하여 히틀러의 집권을 도왔고, 마지노 방어선만 믿다가 불과 40여일 만에 나치의 탱크에 무릎을 꿇어(1940. 6. 22), 전쟁 내내 무대에서 쫓겨난 굴욕과 무력감을, 나치에 협력한 동포들에 대한 분풀이로 투사하였다. 5년 간 독일군 사상자 815만에 포로 185만 명, 악에 받힌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열 명 스무 명씩 프랑스 국민을 무작위로 공개처형하는 공포의 광기 속에 벌어진 부역행위다. 제 손으로 지켜주지 못해 독일군 현지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제 누이들의 머리를 깎고 조리를 돌리는 등 전국적인 린치(私刑)의 향연은, 많은 프랑스 지식인들이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하는 과거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의 일본제국. 경찰서장보다 헌병오장(하사관)이 더 서슬이 퍼렇던 군국주의의 마지막 발악에, 몇 년씩 복역한 애국지사나 기미독립선언문을 지은 문사도 맥없이 끌려 다녔다. 과거의 공은 없던 일로하고, 총칼에 무릎을 꿇은 뒷날의 과(過)만 역적인가? 이념 편향에 이성을 상실하여, 무턱대고 손가락질하는 무리의 맨 앞에 서서, 스승인 미당을 친일로 매도한 인물이 고은이었다.
예로부터 군사부(君師父) 일체, 임금과 스승은 곧 아비와 동격이라는 뜻으로서, 선비의 효성이 지극하면 그 충성심 또한 믿었다. 전체주의국가를 빼고, 현대사회의 임금은 자유민주주의 내 나라쯤 되겠다. 고은은 자신을 등단시켜준(1958) 미당이 별세하자(2000), 반년도 채 못 되어 스승을 비난하는 에세이 ‘미당 담론’을 썼다.
시 ‘자화상’에서 “애비는 종이었다.”를 꼬집어, 실은 소작인을 더 괴롭힌 ‘마름’이었다면서, 태생적 노예근성으로 매도한다.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다.”는 기껏 20대 초의 방황쯤으로 치부하고, 언어 자체가 가지는 허상일 뿐이라 폄하한다.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 란다.”는 세상에 대한 수치가 결여된 체질이란다. 마름은 서울 양반(지주)을 대리하는 중간관리자로서, 상식적으로 노예근성과는 모순된다. 바람은 외도가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것으로 읽어야지, 이런 은유를 왜곡하면 시 자체가 무너진다. 허상과 형이상학을 구분 못하고 있다.
“미당의 시적성취가 기만성에 바탕을 두고..... 역사의식 없이 권력에 안주.....”
원수 간에도 이리는 못한다. 6·25 전쟁 중인 1952년 19세에 절에 들어가 징집을 피하고, 1962년 환속한 자신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수치라고 말하면 모를까...
가족과 인연을 끊고 속세를 버렸다가 다시 파계하고, 스승을 배신하여 저항시인의 아이콘으로 변신한 인생역정을, 변절의 연속이라고 비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승을 앞장서서 매도한 살부사(殺父蛇)의 행적은 노벨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나만 옳을까?’라는 제목은, 필자만 잘못 평가하는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이었다.
‘미투’ 행렬에 한 획을 그은 최영미시인의 고발로 그의 음습한 본색이 드러났다.
자칭 성(聖) 고은은 성(性) 고은이었다. 자신은 신성한 상감마마요, 세상의 모든 여성은 성은(聖恩)에 목마른 후궁 또는 무수리였다. 그래서 최은미씨는 공개적인 ‘산 사람 불알 만지기’를 목격했다고 하니, 쯧쯧.....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