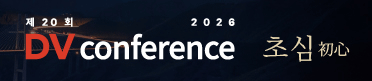선거에선 누군가의 출마 선언보다 이후의 기류가 더 많은 말을 한다. 박영섭 예비후보의 출사표 이후 선거판에서 가장 빠르게 감지된 변화는 ‘지지층의 이동’이 아니라 '기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었다. 왜일까?
박영섭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다. 그는 회무의 흐름에 따라 치협의 대관 업무와 인적 링크를 실제로 핸드링해온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이다. 따라서 대외 협상이나 정책 빌드업을 위한 여의도와의 접점에서 그의 경험치를 넘어설 후보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이 점은 회원들보다 오히려 출마를 준비해온 다른 후보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박영섭의 등장은 다른 주자들에겐 '내가 이 판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를 묻는 원초적 질문이 된다. 이는 용기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성의 문제이다. 누군가가 개원가의 고충을 말할 때, 다른 누군가는 실제로 그 고충을 들고 정부와 협상에 나선 이력으로 맞선다. 이 차이는 선거 국면에선 생각보다 빠르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현 집행부 탄생의 숨은 조력자인 박영섭 예비후보가 '지금은 내 차례'라고 말했을 때 섣불리 반대할 명분 또한 마땅찮다. 그러므로 그가 후보로 나선 이상, 강충규 · 이민정 부회장은 정치적 선택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상대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이다. 다행히 한 사람은 후보 단일화 불발을 이유로 출마를 포기했고, 다른 한 쪽은 짧게 진퇴를 고심 중이다. 여기에 박영섭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자칫 싱거울 뻔 했던 선거에 흥미를 불어넣은 점 역시 박영섭의 등장이 불러온 '작은 공' 효과이다. 1강N약의 구도를 양강의 판세로 재편함으로써 쉽게 예측이 가능한 선거를 팽팽한 접전의 구도로 바꿔놓은 것. 그런 만큼 선거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도 높아져 투표 당일 회원들을 보다 적극적인 유권자로 만들 전망이다.
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상에 그칠지, 아니면 현실의 궤도를 바꿀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가 이미 이전과는 다른 긴장 속으로 들어섰다는 점이다.
박영섭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선거 이후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선거문화를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