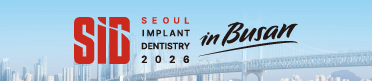얼마전 조선일보의 위크리 비즈에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실렸다.
사과의 효과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대표적인 경우를 바로 의료사고에서 찾고 있다. 이 기사는 '사과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상황이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든다'며, 미국의 사과법(appologty low)을 소개하기도 했다. 내용을 옮기면 이렇다.

의료 사고가 흔히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2006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상원 의원은 학술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기고한 칼럼에서 그 이유로 '의사들이 소송이 두려워 방어적으로 환자들을 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의사와 환자가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연방 의료법 체계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미국 50개 주(州) 중 36개 주에는 '사과법(apology law)'이란 제도가 있다. 클린턴과 오바마의 주장은, 이런 법을 연방법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1986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시작한 이 법의 요지는 의료 사고 현장에서 환자 측에게 의사가 "미안하다(I am sorry)"고 말한 것이 법정에서 의사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환자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의사는 책임 유무를 떠나 환자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공감의 표현이 혹시라도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까 두려움도 있다. 사과법은 의사들의 이런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 비영리 기구 소리웍스(SorryWorks)의 창립자 더그 워체식은 사과법이 특히 의사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사과하기 가장 힘든 직종이 의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사과법이 없다 하더라도 "미안하다"는 말은 피해자를 위한 공감의 표현이므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환자 측의 분노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의 주요 대형 병원들은 '사과법'의 정신을 반영한 의료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기업 위기관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 기업의 사과는 형식적인 '사과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공감과 같은 사과의 철학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대중이 어디에 서 있는가? (Where the public stands?)' 위기를 어느 방향에서 보는지에 따라 사과에 대한 태도는 180도 바뀐다. 로펌은 기업과 오너를 법정에서 보호하는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하지만 위기는 여론의 위치에 설 때 정확하게 보인다.
얼마 전 미국 대형 마트인 타깃(Target)에서 1억명이 넘는 고객 신용 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됐다. 그 회사의 스타인하펠 대표는 위기 대응에서 한 가지에 집중했다. "고객을 위해 옳은 조치를 취한다."
그는 홍보팀의 보도 자료 초안을 본 뒤 마치 변호사가 쓴 것처럼 기업의 입장만을 보호했다면서 불만을 제기했고, 직원들은 보도 자료를 다시 썼다. 오너의 시선으로 안(기업)에서 밖(여론)을 바라보는 것(인사이드 아웃)과 대중의 시선으로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것(아웃사이드 인)은 위기 대응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인사이드 아웃 시각에서 위기 해결의 잘못은 시작되고, 제대로 된 사과와 공감은 더더욱 힘들다.
둘째, '발코니'가 아니라 '플로어'에 서라. 대기업에서 사고가 터지면 오너들은 흔히 발코니에 선다. 그리고 '월급사장'의 사과 뒤에 숨는다.
그러나 최근 코오롱 이웅렬 회장은 계열사가 지은 경주리조트에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이제까지의 위치와 다른 곳에 섰다. 직접 현장(플로어)에 나섰고, 피해자와 만나 사과했다. 거대 기업의 상속자로 그를 기억하던 대중의 태도는 누그러졌다. 결정적 변인은 위치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사과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더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이다. 위기로부터 오너를 분리시켜 내는 방향으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치과에서도 매일매일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환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트러블이다. 잘잘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한쪽에서 선뜻 사과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사과 한번으로 충분히 좋은 관계를 되찾을 수 있는 타이밍까지 놓쳐서는 곤란하다.
'환자가 왜 화가 났는지'를 한번만 더 생각하면 '진상환자'를 '충성환자'로 돌려세울 기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