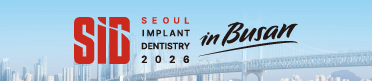고3 때 문과와 이과로 갈라져 사이가 뜸했던 정외과(政外科) K군을, 서울대 연건동 캠퍼스에서 마주쳤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예의 가느다란 눈으로 내려다보며, “어때, 학교 댕길만 하냐?” 문리대 문과나 법대 아닌 의치대(醫齒大)는 직업학교(School)지 그게 어디 사나이가 다닐 대학(College)이냐는 투다. 하기야 이제는 법대도 Law School이다. 주구장창 친구와 어울려, 막걸리 마시며 호연지기를 뽐내던 그 친구의 오버코트는, 한 겨울 삼 개월을 빼고는 일 년 내내 전당포 주인 소유였다
소문에 의하면 당시 발행부수 최고를 자랑하던 D일보 청탁으로, 가끔 사설을 쓰고 술값을 얻어 썼다고도 한다. 이러한 문과계열에 비하면 이과계는 확실히 풍토가 다르다. 예과(豫科) 유기화학 실습시간에, 성분의 존재 유무를 찾아내는 정성분석은 그나마 견딜 만한데, 소수점 세 자리까지 계산하는 정량분석은 정말 죽을 맛이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남의 손을 빌릴 수 없고, 혼자서 끙끙대며 몇 시간을 매달려도, 결과는 항상 알쏭달쏭 했다. 전공은 그렇게 제2의 천성을 만드나 보다. 운동권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온갖 고생을 겪은 K군은, 훗날 청와대 교문수석을 지냈다.
초딩 때 친구끼리 아버지를 ‘오야지’라 불렀는데, 중학교에 가니 ‘꼰대’로 바뀐다. 고교 때는 생활지도 담당 학생과장과 엄한 담임선생도 꼰대에 편입되었고, 요즈음 젊은 세대는 꽉 막히고 오지랖 넓은 노인들을 싸잡아서 꼰대라고 부른단다.
옛날 꼰대라는 호칭에는 친근감이 묻어있었지만, 이제는 비하 내지 경멸의 뜻까지 담겨 있어, 품위 있는 표현은 아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물론 그 말을 쓰는 젊은 세대들을 먼저 비난해야 마땅하지만, 피해당사자(?)의 책임도 적지 않다.
늙으면 일어나는 뇌(腦) 작동의 변화를 짚어보자. 개체의 안녕과 생존을 위하여, 뇌는 불편한 기억을 지우고 유리한 것만 남기므로, 점차 고집과 독선이 우위를 차지한다. 입력기능이 떨어져, 새 지식 새 아이디어의 수납이 지지부진하다. 검색능력(기억력)도 저하되어, 젊은 시절부터 익숙한 원칙과 상식에만 의존한다. 이러한 과정이 몇 십 년 누적되면 자연히 젊은 세대와 이해·소통이 불편하고, 의견충돌도 일어난다. 끝내, “내가 젊었을 때에는 이랬는데, 저러지 않았는데.”하는 명령과 금지(命令 禁止)의 언어를 반복한다. 듣기 좋은 흥타령도 사흘이라고, 만날 때 마다 “나 때에는...” 하니, 불편한 감정을 커피 라떼를 빌려 표현한 말이 바로 ‘라때’라는 은어(隱語)라고 한다. 나를 왜 알아주지 않고 건너뛰느냐는 서운함이 ‘라때’ 증세를 더욱 증폭시켜, 결국 ‘꼰대’가 완성된다.
과학 기술인의 쉼터인 사이언스 빌리지(사빌)에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다. 평균연령 70대 초중반의 사회에서,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때에는,” 라는 말을 듣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사를 포함하여 이과계를 전공하고 연구기관이나 공장에서 평생 봉직하는 과학 기술인들은, 승진이나 보직보다는 기술적인 성취와 연구업적에 몰두한다. 그래서 사빌은 자연스럽게, ‘라때 없는 조용한 사회’였다. 얼마 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코로나는 기승인데다 까다로운(?) 조건이 겹쳐 입주실적이 부진하니, 재단의 고충도 말이 아니어서, 입주조건을 과학기술인의 양가 부모까지 확대·완화하였다. 분위기가 달라져 이젠 라때 스토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불평이 아니라 환영이다. 너무 조용하다 싶던 사회에 ‘모 아니면 도’식 호방한 문과생 기질이 섞이니, 바람직한 생물학적 다양성(?) 아닌가?
다만 분명한 것은 예외는 어디까지나 예외라는 것. 급격한 분위기 변화를 막기 위하여 밥보다 나물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적정비율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덕 연구단지를 구상할 때, 쾌적하고 조용한 부지에 풍부한 녹색지대를 배려한 뜻을 기억하자. 사색하고 명상하는, 건강하고 값있는 노후를 위하여...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전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