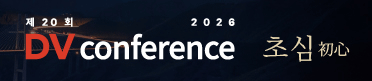대전 역 앞에 명품(?) 중고의류 가게가 있다. 상호가 ‘건빵 * 빈티지’ 이니 별표는 아마도 옛날 건빵 봉지에 들어있던 별사탕인가보다. 제복(Uniform)에 대한 인간의 이중 심리, 기피와 선망을 교묘하게 이용한 마케팅은,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으로 일류 메이커들의 효자상품이 되었다. 유리문에 붙인 글은 더 재미있다.
“가격은 대화입니다(Price is Conversation).” ‘협상의 기술’이 아니라 ‘거래의 진수(眞髓)’다. “말만 잘하면 공짜”와 일맥상통한다. 그렇다. 민주국가에서 서로 뜻이 맞으면 그만이지 거래에 제3자가 왜 끼어드나? 회의석상에서 모든 발언이 사실상 ‘동의(動議)’이듯 일상의 대화는 결국 거래다. 예를 들어 “아빠 구두 잘 닦아놓으면 용돈 2천원.”도 거래다. 여기에 공정위가, “부모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노동력 착취하는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과징금 2만원을 내라!” 하면 되겠는가. 지난해 여름 고용노동부가 ‘제빵사(士)의 본사 직고용’을 명령한 파리바게뜨 사태는 ‘긁어 부스럼’ 식 끼어들기였다. 양측이 서로 돕도록(相助) 권장하기는커녕, 둘 다 죽음(喪弔) 직전까지 몰아간 고약한 해프닝이었다.
문제는 CEO의 ‘선의’다. 재작년 10월 정청래 전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방송인’ 깁갑수 씨의 축사. “... 정권을 잡으면 국정원장을 맡으셔서 작살 낼 놈은 작살내시고 ...” 이처럼 ‘악의’ 마인드는 곤란하다. 김상조(金商祖: 相助나 喪弔가 아님) 공정거래위원장의 어록을 짚어보자. 첫째, “재벌들 혼 좀 내주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는 말. 5개 그룹과의 간담회를 끝내고 경제장관회의에 와서 한 발언이다. 재벌을 내가 학점 주는 학생이나, 적 내지 적폐(敵·積弊)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역력하다. 거래 양측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편견을 가진, “나는 불(不) 공정거래위원장이요”라는 자백인가. 둘째, 서울대 특강에서, “경총(經總)이 노사정 문제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데,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에서 이미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셋째, “각 그룹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은 해당그룹에서 더 잘 알 테니 알아서 시정하라.”는 자아비판 요구다. 공산국가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요, 조선조 시대 “네가 네 죄를 알렸다!”하며 무조건 닦달을 하던 그대로다.
넷째, “대기업은 비 핵심 계열사를 팔아라.”며 네 개 업종을 적시했는데, 재산권 침해·법치주의 훼손에 앞서, 최소한 시스템 통합(SI)과 부동산관리는 무리다. 웬만한 빌딩이나 원룸 주인도 관리사무실을 운영한다. SI 는 사실상 군(軍)의 전략사령부보다 더 중요한 IT의 두뇌로, 해킹 방지·기밀 유지가 생명이다. 사실은 이미지광고를 포함한 광고는 기업의 얼굴이며,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 질’도, 주문한 광고물 제작 부실이 발단이지 않았는가? 자사제품을 팔고 배달하는 데에 자사직원 쓰겠다는 주장도 묵살하기 어렵다. 순환출자와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끼리끼리 특혜성 거래를 막자는 것이 본래의 목적 아니었던가?
관의 개입이 적을수록 행복한 나라라고 한다. 특히 부·청(部廳)이 아닌 ‘위원회’는 과도적, 혁명적 관서라는 느낌이 강하다. 현 정부가 위원회를 많이 늘렸다는데, 시정(施政)보다 사정(査正)이 앞서는 괴물행정이 되기 쉽다. 위원회 업무를 부·청이 인계받아 시정의 한 부분인 사정(司政)이 되어야 한다. 2012년 UD를 바로 잡으려던 집행부가 거꾸로 5억 원의 과징금을 뒤집어 쓴 것도 공정위 결정이었다.
95년 기공료 건을 참조하여 위원회에 진정하고 설득하라는 필자의 비공식 조언은 작동되지 않았다. 치과의사협회라는 대기업(?)의 부당한 ‘담합수가 강요’로 오판한 공정위를, 타 기관이 나서서 말리는 것은 관료사회 속성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
* 협회는 법정투쟁보다는 공정위의 오해를 푸는 데에 집중했어야 한다.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전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