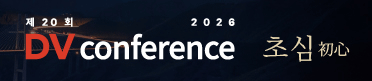개그우먼 김영희씨가 학부형으로 교무실에 불려와 수선을 떠는 여배우 역할을 맡았다. 지적을 받으면, “메소드, 메소드 연기에요.”하며 깔깔깔 웃는다.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현장 은어(jargon)는 생소할뿐더러 번역도 힘들다. 이제는 일상적인 용어가 됐지만, 미장센(mise-en-scene)을 ‘무대 짜임새’라고 번역을 해봐도, 1/3 쯤 아쉬움이 남는다.
영화 ‘몬태나’에서 조셉 대위 역을 맡은 크리스찬 베일(다크 나이트)을 흔히 메소드 연기의 신이라고 일컫는데, 작년 말에는 아예 제목이 메소드인 한국영화가 개봉되었다. 완벽한 연기를 추구하는 중견 배우(박성웅)가, 성적 소수자 역을 맡은 젊은 후배(오승훈)를 몰입으로 이끌어가면서, 자신도 빠져드는 연극인의 세계를 그렸다. 현실과 연극 또는 진·위 자체가 혼란스러운 채 끝나는, 어렵고 불친절하여, 마치 수익을 포기한 독립영화 같은 작품이다.
어느 러시아 연출가의 이론에서 왔다는 메소드는, 주어진 역할에 완벽하게 몰입하는 개성 강한 연기법으로, 역시 우리말로 옮기기가 마땅치 않다. 자나 깨나 서나 앉으나 자신을 잊고, 배역의 인물로 변신하여 말하고 생각하는 연기라면, 조금 험하지만 ‘몰빵 연기’가 딱 맞는 표현이다. 그러나 주연에서 엑스트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배우가 메소드 연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명화가 만들어질까? 자기암시가 지나치면 뿔뿔이 좀비로 변신하여, 드라마라기보다 기획 다큐멘터리가 되지 않을까?
꽃보다 할배의 이순재 신구 양씨는, 오랜 세월 매너리즘에 빠져, 역할에 따른 몰입이나 변신과는 거리가 먼 최악의 대사를 한다. 일제 강점기 신파조에 가깝다. 신파는 무성영화시절 변사처럼 우스꽝스러운 과장의 극치지만(Overact), 하나의 상표가 되어 두 원로 연기자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 사람들은 연극무대나 스크린에 빠져들어, 잠시나마 가벼운 두뇌의 리세팅 내지 힐링을 갈구한다. 그러자면 ‘진짜 같은 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를 원하니까, 지나치게 현실적(Too Real)이 아닌, 약간의 극화(劇化; Dramatize)는 연극의 필수요소다. 진지한 멜로에 푼수 커플을 꼭 끼워 넣는 이유다. 다만 과도한 극화는 현 아재들의 또 아재들이 즐겼던 신파가 되니까, 공연문화의 외연이 영화·TV로 확장되자, 과장과 작위는 점차 설 땅을 잃는다.
1920년대 추리물에서 기원한 하드보일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문체가 핵심이었다. 이차대전 직후 네오리얼리즘을 거쳐 헐리웃의 황금기에, 험프리 보가트·말론 브란도·제임스 딘의 연기는 하드보일드의 영화계 버전으로 대세를 이룬다. 기름 끼를 더 뺀 미키 루크 계열의 절제된 연기(Underplay)가 뒤를 이었고, 한발 더 나아간 극단적인 추구가 바로 메소드 연기가 아닐까.
폭발적으로 늘어난 정보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에 보급되자, 색다른 스토리를 찾는 영화계의 소재 헌팅은 국경을 넘나들고, 글로벌한 부의 편중과 종교를 빙자한 무차별 살육으로 분노와 증오가 범람하면서, 만화 특히 1930년대 황당무계한 영웅(현대인의 메시아?)들이 영화·드라마의 소재로 부활한다. 아동만화나 게임과 구분이 안 되는 천만 달러 단위의 블록버스터들이, 허황된, 그러나 관객의 탈출욕구를 어루만져줄 줄거리와 전개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다큐멘터리 수법을 쓰고 앵커 역할에 메소드 연기의 달인을 투입한다. 관객도 즐겁게 속아주거나 정 아니다 싶으면 ‘킬링타임용’으로 퉁 치면, 어차피 스트레스 해소는 성공이다.
이렇게 만든 영화는, 워라밸(Work-Life-Balance)의 핵심인 생(Life)에 즐거움을 주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아이템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쓰고 보니 국수주의 한글학자라면 펄쩍 뛸 유행어·외국어가 그득한 글이지만, 이 또한 세계화시대의 대세 아닌가?
*‘그들이 사는 세상’ KBS 드라마 2008, 드라마제작진의 세계, 송혜교 현빈 주연.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