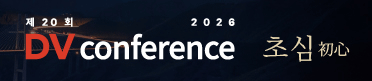1950년대 말까지 길거리 불심검문이 흔했다. 군대를 안간 기피자(draft-dodger) 적발이 목적이었다. 휴전(1953) 직전까지 매일 수백 수천 명이 죽고 다치는 상황을 지켜봤고, 종전이 아닌 언제 또 터질지 모를 휴전상태(cease-fire)에서, 누가 입대하고 싶겠는가? 힘 있고 돈 많으면 외국유학을 가고, 서민들은 모 정치인처럼 오른손 검지(방아쇠 손가락)를 자르거나, 머리 깎고 중이 되어 기피를 했다.
고은 시인이 일초라는 승명으로 절에 있던 시기와 일치한다(1951-62, 18-29세). 동년배들이 생사를 걸고 군에 복무하는 동안, 미당 서정주의 추천을 받아 등단하고(1958) 남다른 편애까지 받았으니, 결초보은해도 모자랄 은혜였다. 환속하고 독재에 맞서 재야의 길을 걸으며, 육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거쳐 “참여시인”이 된 것은 본받을만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미당이 서거하자(2000. 12. 24) 한 해도 지나기 전에 에세이 “미당담론”을 발표하여(2001. 5. 23), “역사의식 없이 권력에 안주” 또는 “미당의 시적 성취가 기만성에 바탕을 두고” 등, 듣기 거북한 비난을 쏟아낸 것은 유감이다.
순수문학이냐 참여문학이냐의 결정도 스승 미당의 자유선택이었고, 이미 60년 전 그 시절에 일제치하를 살아냈던 원로 시인에게, 왜 망명한 애국지사처럼 저항하지 못 했느냐고 소급해서 몰아세우는 것은, 작고한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꼭 10년 전 작가·비평가·전공교수들에게 세계명작 100선을 물은 결과, 외국소설은 전원의 추천으로 까뮈의 “이방인‘이 1위였다. 인간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고 1957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놀라운 것은 ”식민주의 문학“이 세계명작 1위라는 내용을 일간지가 여과 없이 발표한 것은 ”충격“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 식민지이던 알제리에서 출생, 알제대학을 나와 세계적 작가로 성장한 까뮈를 식민자, 그러니까 문화적 지배자로 보는 시각은 더 큰 충격이었다.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이다.
까뮈보다 8살 연상의 사르트르는 파리 출생에 고등사범대 엘리트 코스를 거친 실존주의 철학의 선두자로, 소설·희곡으로도 국민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사회에 참여하는 문학만이 진정한 실존문학이라고 주장한 그는 공산당에 심취하고 스탈린을 열렬히 지지했으나, 실상을 안 뒤에는 지지를 철회하였다. 나이와 학벌 차이에 불구하고 까뮈와 절친하던 사르트르는, 까뮈의 스탈린 비판과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를 계기로 결별한다. 1964년 역시 노벨상에 선정되었으나, 자신의 경쟁자로 여겼던 까뮈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수상을 거부하였다.
사실은 “이념에의 심취와 몇 차례 오판(誤判)”이 사르트르가 선정에서 밀린 이유요, 때늦은 자기반성이 수상거부의 진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이념편향보다 시대정신과 전 인류적인 보편성을 지향하는 노벨상위원회의 선정기준에 100% 찬성한다.
참여의 뜻은 숭고할지라도 결국 편향을 의미하므로, 지나치면 반대 측에 “구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순수가 아마추어라면 참여는 일정한 목적에 기여하니까 어떤 면에서 대가가 있는 프로다. CF에 드라마 상을 주지 않는 것처럼, 프로와 올림픽 금메달은 병립할 수 없다. 격(激)한 참여문학은 선정에서 제외함이 옳을 것이다.
인성(人性)도 중요한 선정기준이다. 선정취지문을 보자. 까뮈는 “시선이 투명한 진지함으로 우리시대 인간의 양심문제를 조명한 중요한 문학적 성취에 값하여...”요, 사르트르는 “풍부한 아이디어와, 자유·진리추구의 정신으로 충만한 작품을 통해 우리시대에 깊은 영향을...”이었다.
행간(行間)이 읽힌다. 국력이 신장되고 상처받은 국격이 치유되면, 1954년 헤밍웨이에게 붙였던, “서술기법의 완벽함(for his Mastery of the Art of Narrative...)"을 원용하여, 이문열 작가에게 희망을 건다. 참, 겨레 고유의 미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눈 감아라!‘로 그려낸 김용택 시인도 있다.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