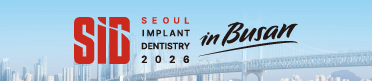사람은 흙으로 빚었다는데, 가난한 사람은 심줄과 피래,
심줄과 피에 가죽과 뼈래. 마음은 여려도 등은 실팍해.
16톤을 캐내면 얼마나 벌지? 하루 더 일을 해도 빚은 더 늘지,
베드로여 내 이름 부르지 마오. 내 영혼은 회사 재산, 나는 못 가오.
듬직한 저음으로 켄터키 석탄광산 광부의 애환을 읊은 노래가, 10주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다(Tennessee Ernie Ford; 1955). 탄소 제로 조기달성을 장담한 나라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 벌겋게 타오르는 코미디를 보고 있지만, 인류의 경제에 첫 번째 비약을 가져온 제1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은 석탄이었다(영국 웨일스 탄광).
막장에서 등이 휘도록 종일 일 해도 16톤 할당량에 미달이면 일당이 뭉텅 깎인다.
일당은 현금이 아니라 매점에서 통용되는 전표(錢票)로 받으니까, 몇 년을 일해도 저축, 즉 ‘탄광 탈출’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영혼을 회사에 저당 잡혀, 베드로가 불러도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못 간다고 일러라!”의 원조요 ‘영끌’의 대명사다. 부자와 빈자는 원자재부터가 다르다고? 앞에 쓴 졸역(拙譯) 1절의 넉 줄 중 뒤 두 줄은 반복되는 후렴(Refrain)이다. 작사자(Merle Travis)가 있지만, 칸츄리 송‘16 톤’은 노동요(勞動謠)의 전형으로, 구성진 선창에 따라 일꾼들은 후렴이라는 추임새로 화답한다. “옳지, 맞아, 힘내!” 그러므로 막노동의 아픔과 사회 기저 층(Low man on the totem pole)의 슬픔을 담은 후렴은, 더욱 묵직한 저음이라야 한다.
기분이 꿀꿀할 때는 짐 리브스의 ‘Blizzard’나 영화 ‘High Noon’ 주제가 ‘날 버리지 마오(Tex Ritter)’를 듣는다. 남일해 안다성 장우의 노래도 역시 좋다.
1995년 SBS의 TV드라마 ‘모래시계’는 하나의 사회현상이었다. 지금도 회자 되는 “나, 지금 떨고 있니?” 같은 명대사와, ‘백학(Crane)’처럼 언제 들어도 감정을 헤집는 OST를 어디서 또 만날까? 전쟁터에 나가 산화한 체첸 병사가 학이 되어 고향을 찾는다는 노랫말을 몰라도, 흐보로스톺스키의 극저음만으로, 절로 장중한 비감에 빠져든다. 격정에 말문이 막혀 후렴 마다 나지막한 허밍(humming)으로 끝나는가?
저음은 왜 사람을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는 것일까. 문자 그대로 밑바닥 소리이기 때문이다. 500 헤르츠 언저리의 저음은 심장의 박동과 공조(共調) 현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저음은 귀가 아니라 심장으로 듣는다 하는가? ‘집시의 탄식’ 같은 바이올린의 흐느낌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2천 헤르츠 이상의 고음은 잘 안 들리니까, LP로 듣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가 더더욱 가슴을 파고든다. 노인이 즐겨 찾는 호텔 라운지에 가면, 우퍼 같은 쿵쿵 심쿵 콘트라배스가 꼭 들어간, 피아노 3, 4중주가 인기 아닌가? 클래식은 물론이고 재즈라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인다.
오랜 세월 시험과 단련을 거쳐 인류의 심신을 달래 온 고전음악은, 드라마 OST로부터 트로트까지, 모든 음악의 발원지요 한류의 원천이다. 해마다 수백 명의 영재들이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뮌헨 밀라노 뉴욕으로 유학하여, 피나는 수련 끝에 유명 콩쿠르를 석권한다. 유럽의 유서 깊은 오페라극장과 콘서트홀에는, 좌석 맨 뒤에 튼실한 브론즈 난간이 남아있다. 입장료를 못 내는 서민용의 입석(立席) 손잡이다.
군주와 귀족이 고된 노동자의 가슴을 따뜻한 음악으로 어루만져 준 것이다. 입석의 반응은 전문가 비평보다도 정확하여, 초연(初演) 작품의 성공 여부를 예고했다고 한다. 16톤 광부는 사라진지 오래요, 이젠 귀족노조 밑에 자영업자가 기층민이며, 도시화가 인구 절반을 넘으니 부르주아는 곧 민중이다. 2000년대에 빌딩이 줄줄이 들어서던 고양시와 성남시의 수입은 고공행진 하여, 예술회관 공연예산이 대전시의 4배가 넘었다(20 : 80억). 이름난 아티스트나 공연을 초청하려면, 지방 도시 두셋이 고양 또는 성남과 합작해야 했다. 답례로 뉴욕시에서 대전 시향을 초청한다. 이름도 생소한 오케스트라의 명연주에 깜짝 놀라 호평이 따르면, 코리아의 국 격과 수출품 가격에 슬그머니 프리미엄이 붙는다. GNP $7만의 선진국이 더욱 성장하는 비결은?
문화예술 투자에는 몇 배의 보답이 따라온다는 것이 정답이다. 2010년 고양과 성남 공연예산이 갑자기 1/4로 깎이면서 합작 기획은 날 샜다. 새로 당선된 시장이, “부르주아를 위한 공연예산을 줄여라!” 했다나? 이래로, 공연계는 침체의 늪에서 헤맨다. 전 성남시장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묻는다. “예술인에게 기본급도 돌아가지 못 할 만큼, 공연예산을 뭉텅 깎아버린다는 소신(所信)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 당시에 고양시장 최성과 성남시장 이재명은 호흡이 척척 맞았다.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전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