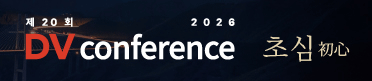베이징대 린젠화 총장이 개교기념식에서, 기러기와 고니를 뜻하는 홍곡(鴻鵠)을 홍호(浩)로 잘못 읽어 구설에 올랐다. 총장은 즉시 사과를 했다. 초중학생 시절에 문화대혁명을 겪어, 기초교육이 불완전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대협 출신들이 대학생활 대부분을 거리에서 보낸 탓으로, 머리가 텅 비었음은 공공연한 국가기밀이라던가? 사실 표의(表意)문자인 한자는 획수가 많고 복잡한데 글자 수도 많아서 익히기 어렵다. 넓은 땅에 방언도 많아 진시황의 갱유분서(坑儒焚書)가, 통일국가로서 문자통일과 사상정리를 위하여 불가피했다는 학설도 있다. 공산중국이 탄생하면서 마오(毛)의 결단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본 따서 만든 간자체는, 문맹퇴치에는 성공했으나, 표의문자의 품격마저 망가져 글자도 못 읽는 총장이 나온 것이다.
오리지널 번체(繁體)에는 상형(象形)문자가 많아서, 전서 예서 해서(篆書 隸書 楷書) 등 서예가 발달하였거니와, 글씨가 아름다움은 물론 초서는 거의 추상화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제 눈에 안경인지 몰라도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 붓글씨가 가장 보기가 좋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간(簡)자와 약(略)자가 판을 치니까, 고전을 연구하려면, 언젠가는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한국에 와서 배워야하지 않을까?
한글은 과학적이며 배워서 쓰기 쉬움을 자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자라기보다 일종의 발음기호일 뿐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표의문자인 한자는, 한 글자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손오공 둔갑하듯 변화가 무쌍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불완전 문자 같다. 지나치게 고문(故事成語)에 의존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주변 국가를 찍어 누르던 패권주의(中華思想)에 맞춰 진화하였다. 일본어는 자모 자체가 우리 삼국시대의 이두(吏讀) 수준에 머물러, 문장의 형태가(pattern) 단순하고 한정된 느낌이다. 고급한 사색의 결과물을 담아내기엔 갑갑해 보인다. 그렇지만 고저장단을 동원해야 하는 중국어처럼 시끄럽지 않고, 최소한 일방적 해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언어가 공통적인 의미를 약속하는 기호라는 점에서 중국보다 훨씬 우수하다. 무례할 정도의 중국식 고집은 그 언어습관에서 비롯한 것일지도 모른다.
고정된 의미(表意)에 얽매이지 않은 언어는 발전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일본어가 중국어보다 우수한 바로 그만큼, 한국어는 일본어보다 더 유리할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노력과 축적을 전제로 한 발전 가능성의 얘기다. 스포츠계에서 흔히 말하기를, 천재는 노력을 따르지 못하고, 노력은 즐기는 자는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
문학적인 성취가 언어 발전의 견인차이긴 하지만, 실생활에서 오락처럼 즐기는 것(Word play)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건배제의나 삼행시 같은 말따먹기도 의미가 있고, 광고의 꽃인 ‘카피 쓰기(Copy writing)’는 순발력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실용(實用)문학에 다름 아니다.
언젠가 도쿄 긴자에서 본 이발소 간판을 소개한 적이 있다. “아타마(頭)데 가루 아타마(髮)”, 즉 머리(頭腦)로 깎는 머리다. 대전 오류동에는 ‘머리 깎 쟁이’ 간판이 있다. 기술자를 뜻하는 ‘장이’와 얄밉고도 날렵한 ‘깍쟁이’, 두 낱말을 교묘하게 범벅 한 재치 넘치는 조어다. “짜장면보다 간짜장이 더 비싼 이유는?” “간 때문이야!” 제약회사의 광고 카피가 히트했기에 함께 웃을 수 있는 난센스퀴즈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다. 백제문화제가 열린 부여삼거리 어느 카페 간판. “몽마르죠 맥주 & 커피” 밑에 작은 글씨로, “지나친 음주는, 감사합니다.” 읽다보면 저절로 웃고 목도 마르니, 몽마르트가 아니라 한들 어찌 한잔 더 마시지 않으랴. 우리말의 내공은 점점 더 깊어만 가는데, 막말도 물귀신처럼 따라다니니...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