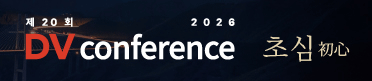고대하던 이차크 펄만을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만났다(11월 14일). 20세기 후반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라는 이름에 전혀 손색이 없었다. 1945년 텔아비브 태생으로 7순을 맞아 월드투어중인 그가 여전히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세련된 기교로 설명되는 천재적 연주 실력이다. 둘째, 네 살 때에 앓은 소아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는 몸이지만,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낙천성과 따뜻한 인간애가 있다. 셋째, 마치 하체로 풀지 못할 운동신경을 보상하듯, 연주 중 연출하는 천의 얼굴·만의 표정이, 못 다한 몸짓언어를 덮고도 남는다.
넷째, 어떠한 난(難)곡도 아름다운 음색으로 쉽게 풀어내는 그만의 해석과 프레이징과 비브라토가 있다. 그 밖에도 듣는 사람에 따라 붙일 말과 호 불호가 다양하겠지만, 지난 반세가 가까운 세월 인기도 1위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세월의 무게에 눌려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걱정은 첫 곡의 첫 소절에 날아갔다
(Leclair 바이올린 소나타 제 3번 D장조, Op. 9). 휴게시간에, 소름 돋도록 감미로운 선율이라는 표현이 필자뿐 아니라 현역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이구동성이었다. 셋째 곡 봄(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 5번 F장조, Op. 24)은, LP와 CD 그리고 Laser Disc(Emi, 1980)로 수도 없이 듣고 봤어도, 현장 연주는 느낌이 달랐다. 황홀한 기교가 재즈의 ad-lib처럼 독창적이고 아름다웠다. 제 1부가 후기 바로크(르클레르)·낭만(브람스)·고전(베토벤)이고, 제 2부에 20세기 조성음악인 라벨(바이올린 소나타 제 2번 G장조)을 배치한 것은, 거의 역사의 흐름에 맞춘 구성이다. 드비시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전음악의 인상파 라벨. 고전음악을 감상하려면 어느 정도의 길들이기(듣는 훈련)를 거쳐야 하고, 현대로 올수록 서정적인 선율보다는 불규칙한 불협화음(arrhythmic cacophony)이 많아, 때로는 상당한 인내를 요한다. 이런 때는 이렇게 자기최면을 걸면 된다. “이것은 소리 나는 추상화, 귀로 듣는 피카소야.”라고. 조금씩 이해가 오고, 시간이 가면 뇌가 스스로 작곡자의 보이지 않는 감정 선과 숨은 리듬을 찾아낸다. 취한 듯 어느 새 지나간 앙코르는 무려 6곡의 보석 같은 소품들. 악보(music sheet)를 한 자 높이로 쌓아놓고 무작위로 뽑아내어, 70에도 녹슬지 않은 암보(暗譜)능력을 과시한다. 물론 그 악보는 펄만과 찰떡궁합인 스리랑카 출신 로한 드 실바의 피아노반주용이다. 코렐리·슈만·브람스도 좋지만,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 ‘쉰들러 리스트(1993)’는 환상적이었다. 유태인으로서 나치의 희생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하고 싶어 영화음악을 연주했다는 펄만의 인터뷰를 기억한다. 본래 펄만은 영화‘게이샤의 추억(2005)’이나 재즈 연주 등 콜라보가 폭 넓고 다양하다. 연주회 뒤 반시간 가까이 로비를 떠나지 못하고, 진한 감동의 뒤풀이를 주고받은 밤이었다.
젊은 시절 천변만화하던 펄만의 표정은 잔잔하고 안정감 있는 미소로, 우렁차고 정열적인 음색은 조금 작지만 세심한 부드러움으로 진화하여, 듣는 이를 별세계로 인도한다. 또래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 “아, 이제는 노후계획을 다시 짜야겠어.” 인간사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기대수명을 백세로 고쳐 잡자는 것이다. 나이 70에 초일류의 기량을 잃지 않고 더욱 농익은 저 모습.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은퇴(retire)는 낡은 타이어 갈아 끼기(re-tire)요 신들매 고쳐 매기다. 다시 뛸 시간이다.
마무리는 내일 세상이 끝날 것처럼 철저히 하되, 목표만은 눈을 들어 높은 곳을 향하자.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