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도 남자 짝이에요, 엄마. 난 왜 맨 날 남자 짝이지?”
아들이 초등학교 때 매일 하던 푸념이다. 키가 약간 크기도 하지만, 워낙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가 차이가 나니까 남자애들끼리 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매번 여자 짝을 기대했다가 안 되면 속상한 마음을 애꿎은 엄마에 대한 신경질로 푸는 게 안쓰럽긴 했다. 그렇다고 우리 애만 여학생과 짝 지워달라는 것도 부모의 이기심인 것 같아 표시내지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여학생 짝하고 알콩달콩 실랑이를 하며 서서히 시작되는 사춘기를 자연스럽게 넘겼는데, 남학생만 득실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변변한 연애 한번 못했다는 아들이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없을까봐 안타까워하는 아내가 이해가 되기도 한다.
요즘이야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구분 없이 별로 낳지 않는 추세지만, 그 와중에도 면면히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으니, ‘남아선호사상’이 그것이다. 아이 하나 잘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드는지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그 하나나 둘뿐인 자식 중에 아들이 없으면 왠지 힘이 없다고들 했다. 실제로 하나의 아들을 위해 누나가 대여섯인 집도 흔했고, 아들 하나 대학교육 시킨다고 누나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것조차 거북해했었다. 지금의 우리 딸들이 들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일이지만,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들이다.
출산 전에 태아 감별해 주는 의사들을 엄벌에 처한다는 시책이 내렸던 시절, 당시 산부인과 전공의로 갓 시작했던 선배 하나가 자신의 셋 째 아기가 생겼는데, 위로 둘이 모두 딸인지라 뱃속의 아기 성별이 너무 궁금했지만, 선배들을 곤란하게 만들기 싫어 밤에 몰래 아내를 대학병원 초음파실로 불렀다. 자세한 작동법이나 세밀한 진단은 배운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엄두도 못 냈지만, 기계를 켜고 끄거나 얼추 검사하는 모양은 옆에서 봤던지라 아내 앞에서 갖은 폼을 잡고 뱃속의 아기를 비췄는데, 아기의 양다리 사이에 선명한 혹 덩어리가 틀림없이 보였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아들이라고 장담하고 모든 출산준비는 아들용품을 미리 사놓고 좋아했는데, 막상 낳고 보니 예쁜 공주가 아닌가. 나중에 초음파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보니, 임신 초기의 아기의 성기는 남녀가 매우 비슷한 모양이라 숙달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점을 몰랐던 것이었다. 결국 그 선배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딸 셋을 열심히 키웠는데, 지금은 사연 속 셋째 딸이 해외유학을 스스로 장학금을 타며 마쳐간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간혹 뱃속에서 뿐 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남녀의 구별이 모호할 때도 있다. 고추가 있는데 소변구멍이 엉뚱한데 있기도 하고, 여자아기의 모습인데 제법 큰 고추가 달려있을 수도 있다. 이런 아기들이 자신의 맞는 성을 찾기 위해 어린 나이에도 수술치료나 장기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이런 아기들을 보면 아들이든 딸이든 정상이고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된다.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다.
성기의 모양이 애매한 아기는 부모끼리 아무렇게나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타고난 신체의 성별과 부모가 각인시킨 사회의 성별이 다른 것이 뒤늦게 밝혀져 평생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의 아기들은 너무나 소중하며, 건강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하며 잘 키우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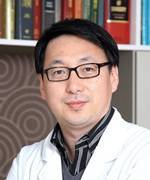
글: 조성완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