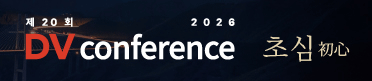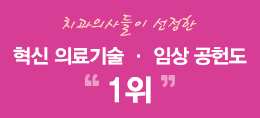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엄흥식 교수(치주과학교실)가 '말하는 벽'을 제목으로 네번째 사진전을 갖는다. 이번 사진전은 오는 15(화)~20일(일)은 강릉아트센터 1전시실에서, 23(수)~28일(월)엔 장소를 서울 갤러리 인사아트로 옮겨 열린다.
전시회에선 엄 작가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만의 앵글로 기록한 '벽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주장과 표현, 외침, 알림'이 작품이 되어 갤러리와 마주한다.
엄흥식 교수는 강릉에서 활동하는 사진가 모임인 '사진나루' 회원으로, 2012년 강릉문화예술관에서 첫 개인전 '빛, 그 안에서'를, 2017년 두번째 개인전 'Small Instruments'를 인사동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가졌었다.

■ 작가의 말
벽이나 담은 구획, 분리, 차단, 출입거부를 위해 세워진다. 하지만 그 표면에 누군가가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벽보를 붙이면 대화와 소통의 장이라는 정반대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라피티로 뒤덮인 베를린 장벽을 보고 화가 페터 클라센이 한 말처럼 ‘대화를 막기 위해 고안된 벽이 대화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어느 거리에서나 볼 수 있는 벽에서 사람들의 –특히 젊은이들의- 주장, 표현, 외침과 알림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라티피나 거리미술 작품도 많다. 작품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심지어 지워지기도 하는 작품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갤러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미술에 대한 저항이며, 예술이란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외침일 것이다. 말하는 벽은 왜 거리를 광고와 같은 사유자본이 차지하는가, 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도시의 벽화나 낙서는 좁은 골목에 그려져 있는 것이 많아 사진으로 기록하고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는 부분 부분을 클로즈업 촬영하여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나 치과용 기구의 사진을 만들어왔는데, 이 방법을 응용하여 골목의 벽을 사진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나를 지도해 주시던 이종만 선생님께서 <말하는 벽> 작업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생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제자의 전시회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