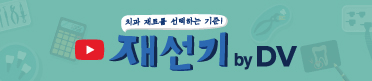긴 능선이 하늘을 받치고 있다
그 아래 하나 둘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거운 불빛
한 곳 트일 데 없는 막막한 어둠
하루를 후미진 산골을 돌아본들
넝마처럼 해진 삶은 더욱 황량하고
휴게소에서 내려
뜨거운 국수국물을 마신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끓임없이 뉘우치고만 있을 것인가
타락의 대열 한귀퉁이에서
파멸의 행진 그 한귀퉁이에서
대폿집에서 찻집에서 시골길에서
길은 어둠 속을 향해 뻗쳐 있고
다시 버스는 힘을 다해 달리는데
긴 능선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그 허공 속에서 문득
말없이 사는 이들의 숨죽인
울음소리를 듣는다
[길]
추석 연휴, 어릴 적 다니던 국민학교엘 갔습니다.
운동장은 기억속에서 보다 훨씬 좁았고,
크게만 느껴졌던 2층 교사도 을씨년스레 키가 줄어 있었습니다.
운동장 한옆 줄지어 선 플라타너스 몸통엔
상처처럼 아이들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학이, 정흠이, 병욱이, 연희, 태석이..
이름의 주인들은 새로 난 신작로를 따라 오래전 이곳을 떠났습니다.
동네까지 찻길이 이어지고, 버스가 다니면서부터
아이들은 떠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면소재지 5일장을 드나들더니 읍내 구경을 다니다가
종내는 길 끝 아득히 이어진 대처로 나갔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길인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듯 그렇게 손 흔들며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은 이미 낯선 이들의 마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감아도 익숙할 골목엘 들어서고도
본 적 없는 얼굴들과 마주치게 되는 상황은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뒷산이며, 강가며, 후미진 기억속의 곳곳을 돌아본들
시간은 이미 불어난 강물처럼 이곳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늙으신 어머니와 저녁상을 마주 하고 앉았습니다.
탕국에 밥을 말아 천천히, 오래도록 씹었습니다.
길들여진 미각이 온몸으로 퍼져 나가는 동안
가슴 한편에 싸한 무언가가 밀려왔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1956년 '문학예술'지 추천으로 등단했으니 올해로 등단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선생은 전국을 발로 누비며 작품활동을 했습니다. 선생이 1985년에 펴낸 민요기행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문지리서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시 '시골길에서'는 선생의 두번째 시집 '새재'(1979년 창작과비평사 刊)에 들어 있습니다. 그의 시가 대부분 그렇듯 '시골길에서' 역시 이 땅에 빌붙어 소리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같은 시집에 수록된 짧은 시 '산까치' 전문.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과수원
샛길을 지나 산등성에 올랐다.
추워 떠는 여윈 풀꽃에 덮여
묵뫼는 한 천년 엎드려 울고
땀을 식히며
고향의 헌 거리를 굽어본다.
산까치가 될 건가, 늙은 느티나무에
머리를 부딪치며 울고 싶은 산길
원통한 산바람
노예들의 헛된 싸움터를 쫓아
산성을 돈다. 머리로 종을 때려
깊이 잠든 친구를 깨워 세울
산까치도 될 수 없는 고향 언덕에서